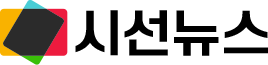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프랑스 농업공학자 막시밀리앙 링겔만은 ‘줄다리기 실험’을 했다. 10kg 정도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이 모였을 때, 그에 비례한 힘이 발휘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8명이 당겼을 때 40kg 정도의 힘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부른다.
‘링겔만 효과’는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집단의 크기가 증가했는데도 되려 덜 생산적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막시밀리앙 링겔만에 의해 발견되었기에 오늘날 ‘링겔만 효과’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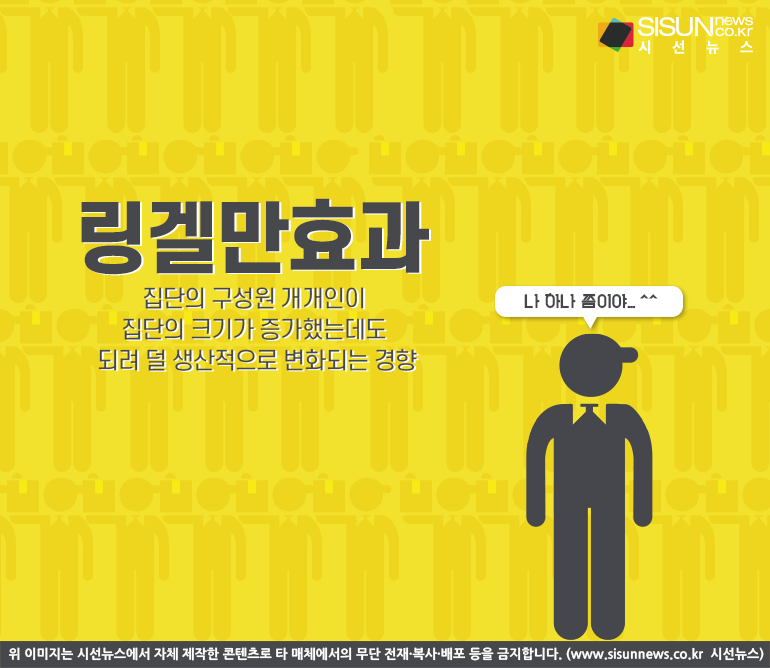
링겔만이 실험을 했을 때, 실험 참여자들은 각각 2명, 3명, 8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나뉘었다. 실험 결과, 모든 그룹이 기대치보다 낮은 힘을 발휘했다. 2명은 자신의 약 93%의 힘, 3명은 약 85%의 힘, 8명은 약 49%의 힘을 썼다. 구성원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1인당 공헌도는 낮아진 것이다.
이 실험에 앞서 링겔만은 말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수레를 끄는 한 마리의 말을 보고, 두 마리의 말이 있으면 힘도 두 배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마리의 말이 더 있다고 해서 힘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이 사람에게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줄다리기 실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링겔만 효과가 발생할까? 먼저, 집단에서 구성원이 자신의 존재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나타날 확률이 높다. 구성원이 ‘내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곧 그의 의욕이 저하되고 능률도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여도가 평가되지 않을 때도 구성원의 능률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속한 집단의 구성원 대부분이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만 노력하는 게 어느 순간 어리석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노력하던 구성원도 점점 집단의 노력 수준과 비슷하게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 집단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1인당 성과가 낮아지고, 집단 전체의 성장 역시 더뎌지게 된다.
링겔만 효과는 이후 다른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빕 라타네는 참여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손뼉을 치도록 했다. 그러자 실험 참여자들은 두 명일 때 약 82%, 셋 이상일 때 약 74%의 소리만 내었다.
실생활에서도 누구나 한 번은 이 같은 일을 겪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조별 과제’이다. 원래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지만, 실상은 학점이 절실한 일부 학생들만 열정과 노력을 쏟는다. 조별 과제에서 ‘무임승차’하는 학생은 어디에도 있기에 이와 관련한 풍자와 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누가 특별히 태만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링겔만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집단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거나, 집단에 과하지 않은 수의 인원이 배치된다면 개인이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게 된다. 만일 집단에서 개인의 공헌도가 너무 적다면, 집단 환경에 대한 고민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것이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 상장 폐지 앞둔 150년 역사의 기업 ‘도시바’, 올바른 경영의 중요성 시사 [지식용어]
- 100경분의 1초 ‘아토초’, 전자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는 시간 단위 [지식용어]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작...각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하마스’ [지식용어]
- 배우 이제훈으로 이슈된 ‘허혈성 대장염’, 어떤 질병일까? [지식용어]
- 지적장애와 평균 사이 소외된 공간에 놓인 ‘느린 학습자’...사각지대 해소필요해 [지식용어]
- 비윤리적 행동으로 명예 실추시킨 임직원의 성과급 환수 규정 ‘클로백’ [지식용어]
- [2분뉴스] 23년 10월 25일 주요뉴스 #카타르 #이스라엘 #럼피스킨병 #조민 #조수미 #시선뉴스
- 드라마 ‘국민사형투표’로 이슈된 ‘플레비사이트’, 법적 효력 없는 국민투표 [지식용어]
- 각종 질병이 독촉하는 ‘면역빚’...마스크 벗자 유행하는 독감 [지식용어]
- 소행성 ‘프시케’를 찾아 떠난 탐사선 ‘프시케’의 임무는? [지식용어]
-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뱅크데믹’...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위기 확산 [지식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