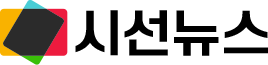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추구해 왔지만, 우리는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결코 긍정을 답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여전히 차별의 요소는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고, 특히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커다란 장벽은 곳곳에 놓여 있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소외감 속에 ‘더불어 살가가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최근에는 ‘느린 학습자’들이 장에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느린 학습자'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말 그대로 평균 지능에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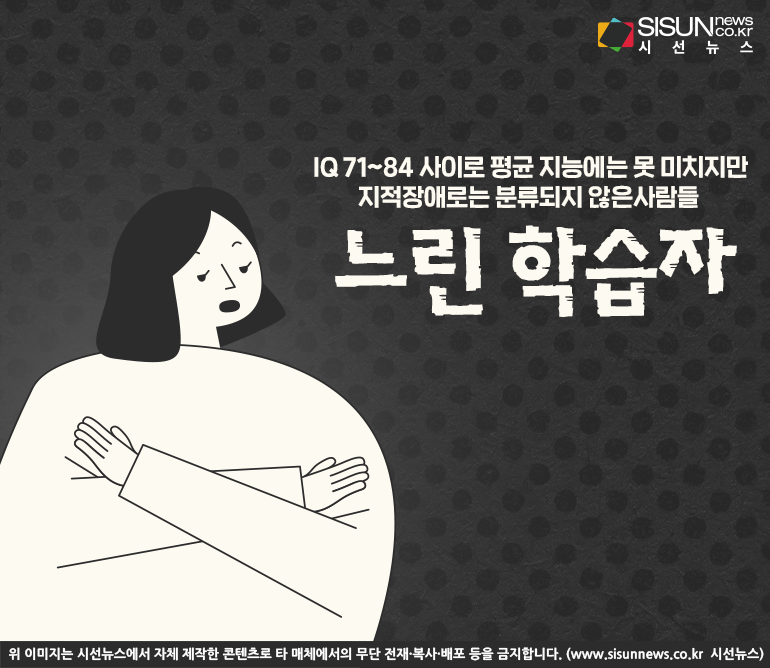
느린 학습자들의 지능을 수치적으로 보면, 보통 지적장애 등록 기준은 지능지수(IQ) 70이하고, 평균 지능은 IQ85이상을 말하는데, 느린 학습자는 이 사이인 IQ 71에서 84사이인 경우를 말한다. 지능이 평균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지적장애 수준까지 낮은 것은 아니라 ‘느리지만 천천히 배워간다’는 의미를 담아 느린 학습자로 부른다.
‘느린 학습자’. 어쩌면 지적장애보다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들의 현실은 어려움 투성이다. 분명 낮은 인지능력으로 일상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서 각종 지원이나 도움을 받기는 또 어렵다. 지적장애인 그룹에 들지 못하고, 그렇다고 평균 집단에도 끼지 못한 채 복지·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느린 학습자는 복지법상 장애등록을 할 수 없고, 특수교육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느린 학습자 수는 생각보다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지만, 지능지수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해보면 전체 인구의 13.5%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수치상으로 무려 700만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지적장애 집단2.3%보다 무려 6배가량 많은 규모다.
물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느린 학습자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광주를 포함해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는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데다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검사 체계도 없어 아이들의 경우 일반적인 학교생활 중 학습에 어려움이 커진 뒤에야 느린 학습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린 학습자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을 향하는 비뚤어진 인식과 시선에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한다.
아직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지적장애도 평균도 아닌 소외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느린 학습자’. 많은 도움이 절실함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제대로된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그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시선은 없었는지 사회도 함께 돌아봐야 할 때이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 영원한 ‘따거’ 주윤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드러난 천생 ‘영화인’ 면모 [지식용어]
- ‘문화계 블랙리스트’...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지식용어]
- 한국형 아이언맨을 꿈꿨던 ‘일렉트로맨’...영화의 꿈 접는다 [지식용어]
- 범죄자 인상착의 사진 ‘머그샷’, 우리나라는 거부할 수 있는 이유 [지식용어]
- ‘애플’ 혁명 이끈 스티브 잡스의 아들 ‘리드 잡스’...암 정복에 한 획 그을까 [지식용어]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작...각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하마스’ [지식용어]
- 100경분의 1초 ‘아토초’, 전자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는 시간 단위 [지식용어]
- 상장 폐지 앞둔 150년 역사의 기업 ‘도시바’, 올바른 경영의 중요성 시사 [지식용어]
- ‘무임승차’를 만드는 ‘링겔만 효과’... 힘을 보탠다고 늘지 않아 [지식용어]
- 드라마 ‘국민사형투표’로 이슈된 ‘플레비사이트’, 법적 효력 없는 국민투표 [지식용어]
- 비윤리적 행동으로 명예 실추시킨 임직원의 성과급 환수 규정 ‘클로백’ [지식용어]
-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로 경제를 부양하는 ‘투자주도성장’ [지식용어]
- 중국 MZ의 조용한 반항 ‘역겨운 출근룩’...“옷 잘 입으면 월급 더 주나요?” [지식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