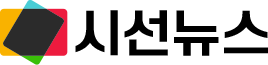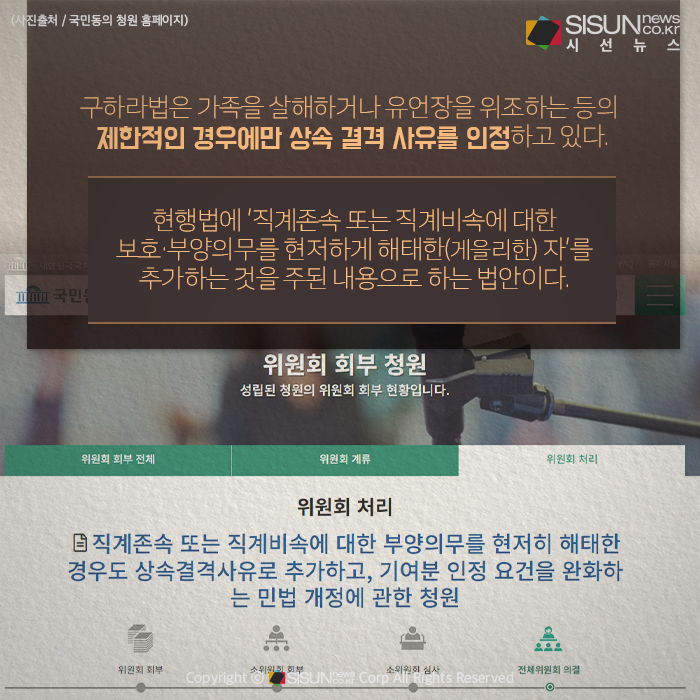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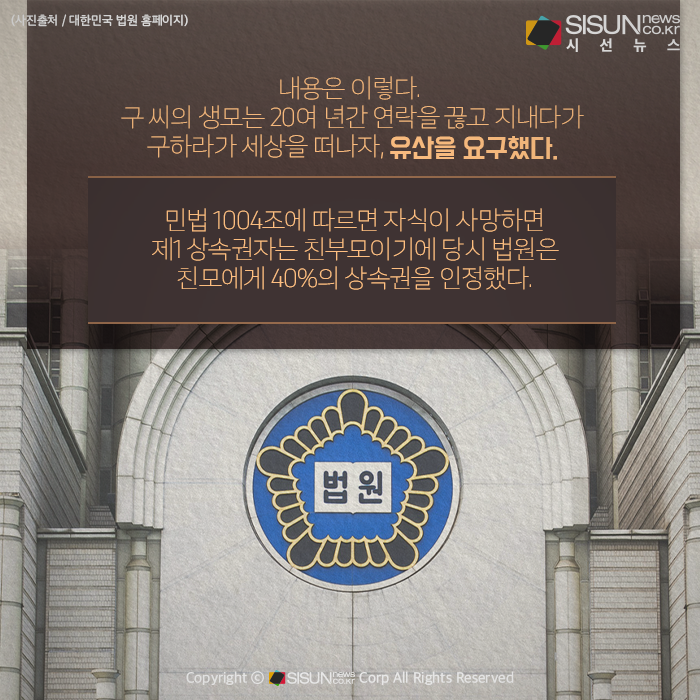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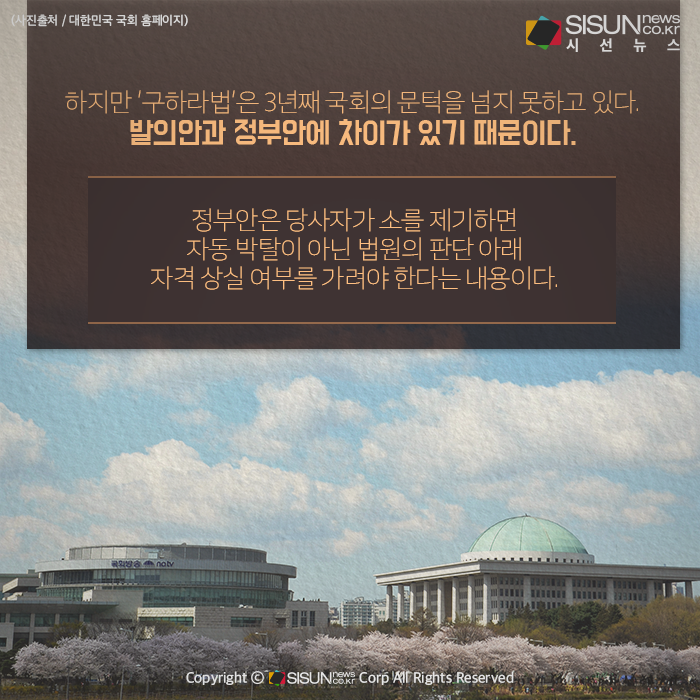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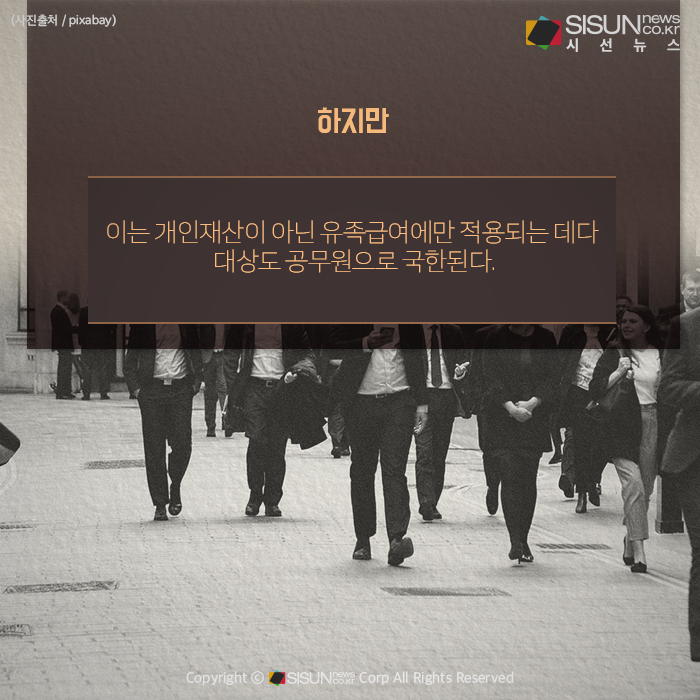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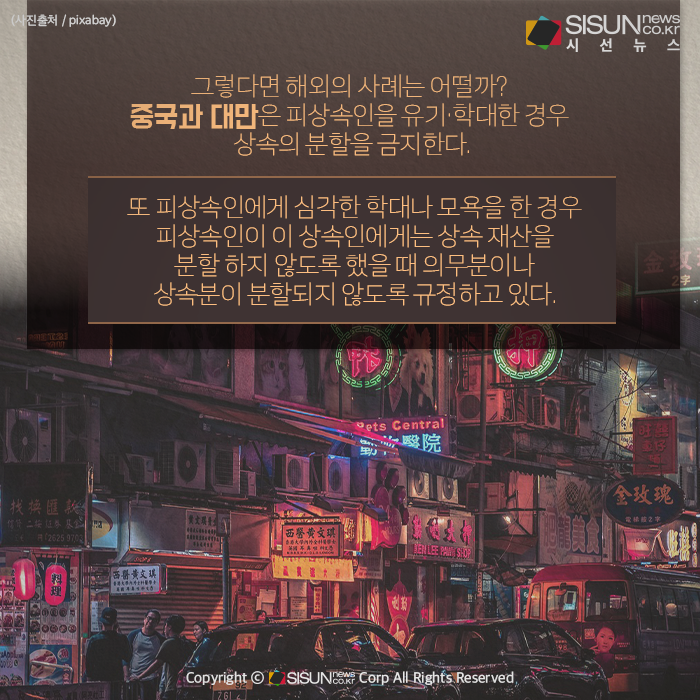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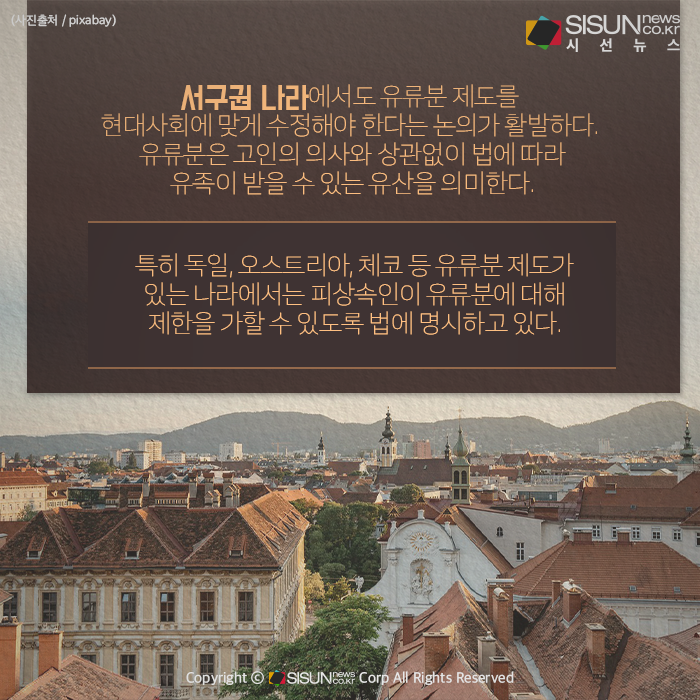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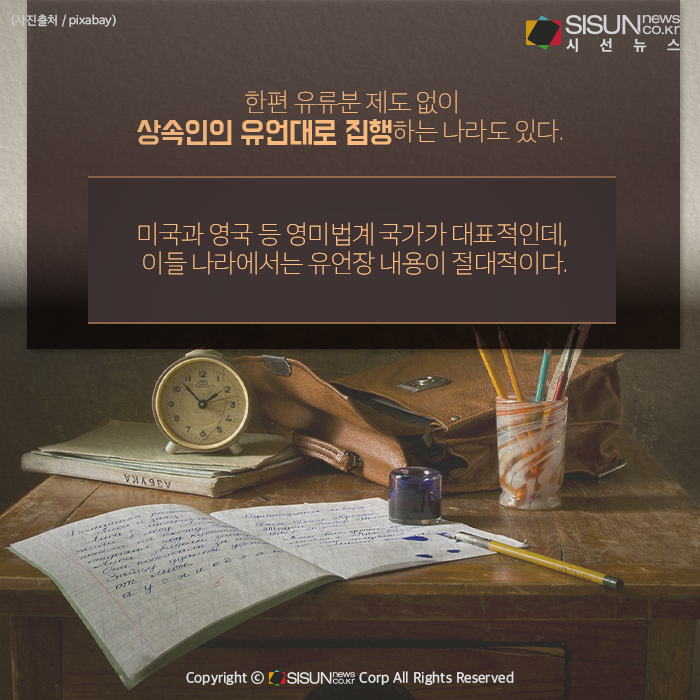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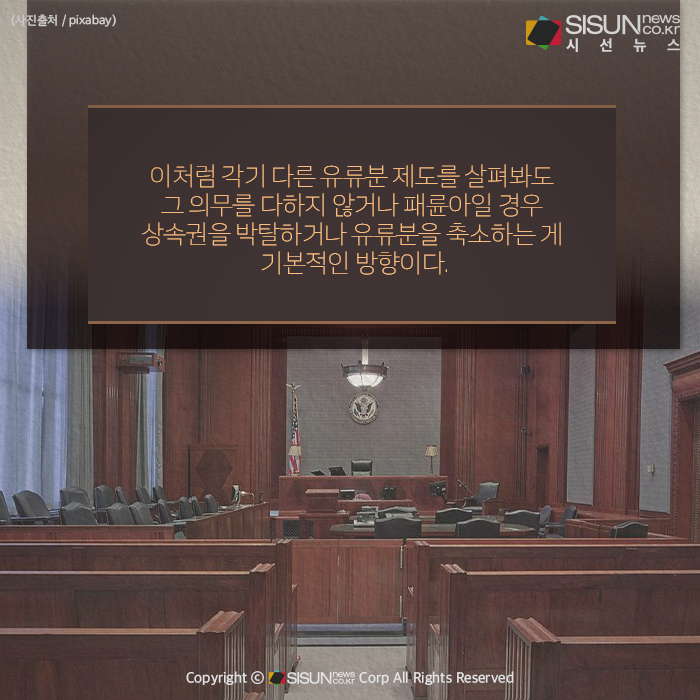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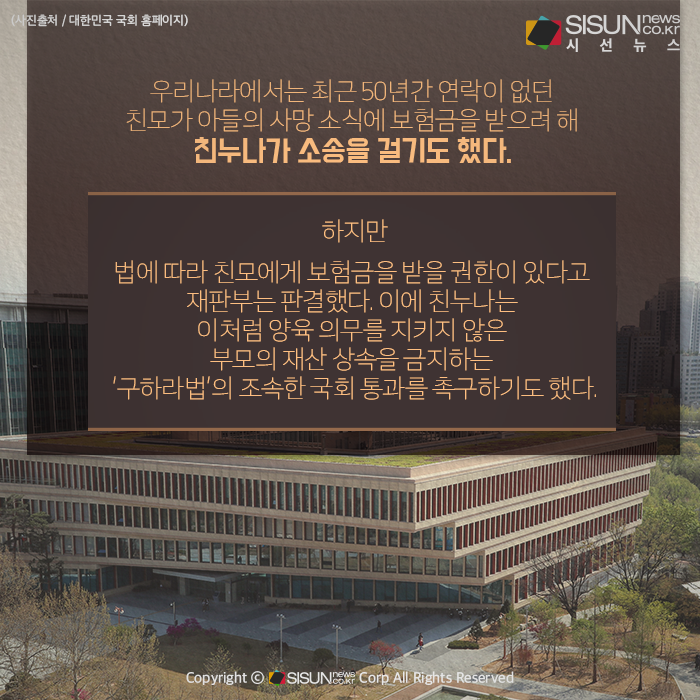

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구하라법’은 가수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추진한 법안으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구 씨의 생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유산을 요구했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자식이 사망하면 제1 상속권자는 친부모이기에 당시 법원은 친모에게 40%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친권을 포기했음에도 유산을 요구했던 것이 대중의 반발을 일으켰으나, 통상 판례를 볼 때 절반의 상속이 인정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10%라도 덜 받도록 판결받아 낸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에 구하라의 오빠와 변호인이 2020년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양육 의무 위반을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해 자동으로 상속 자격이 박탈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구하라법’은 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발의안과 정부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자동 박탈이 아닌 법원의 판단 아래 자격 상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반쪽짜리 구하라법’인 ‘공무원 구하라법’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식 명칭은 '개정 공무원 재해 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인데, 해당 법에는 양육책임을 방기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반쪽짜리 구하라법’에 대해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개인재산이 아닌 유족급여에만 적용되는 데다 대상도 공무원으로 국한됐기 때문이다.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가까운 중국과 대만은 ‘구하라법’과 유사하게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경우 상속의 분할을 금지한다. 또 피상속인에게 심각한 학대나 모욕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이 상속인에게는 상속 재산을 분할 하지 않도록 했을 때 의무분이나 상속분이 분할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비슷하게 상속인을 학대 또는 모욕하거나, 상속인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상속인 폐제 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권 나라에서도 유류분 제도를 현대사회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류분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유류분은 '가족'과 관련된 사법 질서 전체를 향도하는 근본적 가치 규범을 포함하고 있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공동체를 존중하고 지원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반적인 가족 관계를 명백히 벗어난 중대한 비행을 저지르고, 피상속인이 비행 가족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최종적 의사를 표한다면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민법에는 ‘피상속인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자녀가 조력을 제공하지 않고 방임한 경우’에 자녀의 유류분권을 상실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체코는 ‘피상속인이 질병, 고령이나 기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때’에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유류분 제도 없이 상속인의 유언대로 집행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가 대표적인데, 이들 나라에서는 유언장 내용이 절대적이다.
각기 다른 유류분 제도를 살펴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패륜아일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유류분을 축소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50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아들의 사망 소식에 보험금을 받으려 해 친누나가 소송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친모에게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이에 친누나는 이처럼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 [카드뉴스] 추석연휴 아이와 함께 보기 좋은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 [카드뉴스] 암을 앎! 갑상선암-폐암-대장암-위암 등 다양한 암 예방 법
- [카드뉴스] 동물의 이모저모 – 순하고 귀여운 ‘스코티시폴드’
- [카드뉴스] 음악에 따라 심장 박동이 달라진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들
- [카드뉴스] 2024년도 예산안 논의...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들
- [카드뉴스] 끊이지 않는 ‘탕후루’ 열풍, 과일을 넘어 빙수까지
- [카드뉴스] 추석 대비! 알아두면 좋은 정보...자동차 긴급출동-은행 탄력 점포 등
- [카드뉴스] 한가위 흥 돋우는 ‘추석 특선’ 영화...가족과 함께 볼만한 작품들
- [카드뉴스] 과거 단식 투쟁한 정치인들...그들이 단식을 선택한 이유
- [카드뉴스] 택배의 민족 대한민국, 택배는 언제부터 시작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