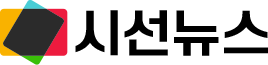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시선뉴스 심재민] 보통 사람들에게 버스를 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버스의 통상 89cm의 이르는 계단이 보통의 신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약자, 신체가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는 이 90cm에 미치지 못하는 계단은 버스 탑승을 막는 커다란 장벽이 된다. 버스를 타는 데에도 이러한 장벽이 있다면 그들이 느끼는 세상의 벽은 얼마나 높게만 느껴질까.
이 같은 장벽을 허물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버스가 있다. 바로 ‘저상버스’이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의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되어 있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오르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말한다.

저상버스는 1976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독일,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 선진국의 대도시에서 1990년대 초부터 일반화되었다. 그 필요성을 느낀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상버스의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으나, 보도의 높이가 도로에 따라 다른 등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는 도로 여건상 많은 문제가 있어 도입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3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잇는 주요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20대를 시범 운영했다. 그러다 2004년 저상버스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이동보장법안’아 발의 되었고 이 법안은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안’과 병합심사를 받아 200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도입을 점차 확대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법안이 만들어진지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 과연 법안처럼 저상버스의 도입이 잘 되었을까?
대답은 ‘아직 멀었다’이다. 서울 시내 운행 중인 버스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 비율이 당초 계획이나 관련 규정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도입된 저상버스는 2천816대로, 전체 버스 7천427대의 37.9%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까지 운행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미 도입했어야 할 3천590대보다 774대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방 도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은 10대 중 4대(37.9%)가 저상버스 이지만 서울과 부산 제외한 전국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9천7백여 대 가운데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나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한 대도 없다. 이에 작년 7월 장애인과 노인 등 다섯 명이 버스업체와 지자체를 상대로 시외버스에 탑승편의시설을 만들라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지만, 양쪽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며 국내 도입이 10년을 훌쩍 넘었지만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전국의 많은 교통약자는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보통사람 들에게는 편리한 교통수단 버스가 누군가에게는 90cm의 계단으로 ‘고통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