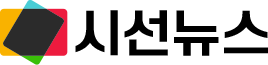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해외여행의 증가와 함께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발생이 국내외에서 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한국의 말라리아 환자는 5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명)의 2배를 넘겼고, 뎅기열 환자는 1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배 증가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말라리아는 예방약이 있지만, 뎅기열은 마땅한 치료약이 없으며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점이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뎅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에게 물리면 전염되는데, 해당 모기는 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지방과 아열대 지방에 분포한다. 우리나라 뎅기열 환자의 경우 거의 전체가 해외 유입이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감염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뎅기열에 걸리면 갑작스레 고열이 발생해 3~5일간 지속되고, 심한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등이 생긴다. 증상 초기엔 신체 전반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후에는 열이 떨어지고 온몸에 피부 발진이 1~5일간 계속되며 코피나 잇몸 출혈 등 가벼운 출혈이 나타난다. 성인의 경우 혈변을 보거나 월경과다, 목 부위의 림프절이 붓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뎅기열이 심해지면 뎅기 출혈열이나 뎅기 쇼크 증후군(dengue hemorrhagic fever)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다 급격히 악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불안증세를 동반하거나 식은땀이 나고 입 주위가 파랗게 되기도 하며, 복수가 생겨 배가 불러질 수도 있다. 또 혈소판 감소가 심하게 오는 경우 몸에서 출혈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출혈뿐 아니라 혈압이 떨어져 다른 장기들의 기능까지 저하되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적극적인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다. 병을 앓으며 환자가 겪는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만 있을 뿐이다. 보통의 뎅기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저절로 낫는다.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기에 뎅기열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도 예방을 강조하는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뎅기열 위험 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은 뎅기열 예방을 위해 모기 기피 용품(모기 기피제, 모기장 등)을 준비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3~4시간 간격)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뎅기열을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법정감염병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로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는 병이다. 제3급에는 B·C형 간염, 파상풍 등 26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격리가 필요 없지만, 발생률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의 뎅기열 발생 국가에서 전년 대비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배 이상 증가했고, 방글라데시에선 역대 최대 규모, 태국에선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뎅기열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모기 매개 감염병이 늘어난 데에는 해외여행을 비롯한 이동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 기후변화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공항과 항만의 국립검역소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무료로 뎅기열 선제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위험 국가를 다녀왔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길 바란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