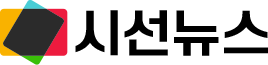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시선뉴스 이호] 약속이나 한 듯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과 8범의 A(26) 씨는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3월형을 살고 나와 2020년까지 8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함께 생을 마감하자며 접근해서는 성폭행을 하려 했다가 실패하자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주택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다.
A 씨는 경찰을 피해 나흘 동안 도주했지만 결국 순찰중인 지구대원들의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되었다. A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전자발찌를 훼손하여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살았고 부착 기한도 연장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2일 경북 경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떼버리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도주 한 지 11시간 만에 영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B(34) 씨는 춘천시 퇴계동 한 건물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후 행방을 감췄다가 11시간 만에 경기도 오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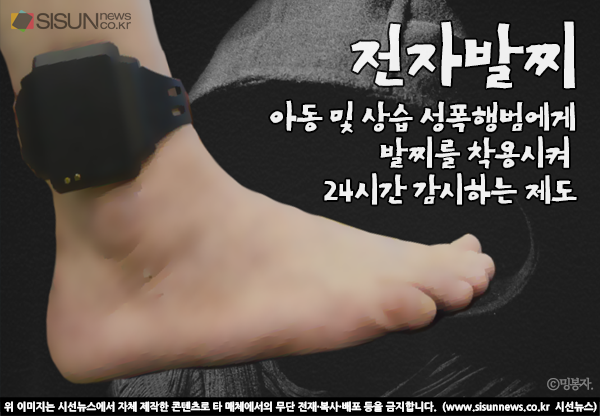
2018년 12월 기준 전국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범죄자는 3,160명에 달한다. 전자발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부가조치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위의 사건들을 보면 알겠지만 과연 전자발찌가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첫 번째, 훼손이 너무나 쉽다. 일반적인 도구만 있으면 도주를 꿈꾸고 있는 범죄자들이 얼마든 훼손하고 달아날 수 있다.
두 번째 관찰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7월말 기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1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담당하다고 나타났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다. 재범의 의사가 있는 범죄자들은 언제든 도주할 타이밍만 재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도주 후 알아차리는 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재범 의사가 있는 범죄자들은 보통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상황이므로 늦게 발견하여 다시 검거했을 때는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을 위험이 크다.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이유는 ‘관리’를 위해서다. 관리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전자발찌는 그저 불편한 장신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재범을 막지 못하고 사건이 다 벌어진 후에 검거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럴 바에는 그 기간을 수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벌써 11년차가 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점 발견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별로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위치추적기와 일체화된 신형 전자발찌를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 역시 다 무시할 수 있지 않은가.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는 인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범죄자들에게 착용시키는 물건이 아닌 만큼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