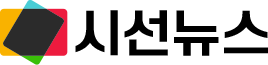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 잔 할까?” 영화 ‘내부자’에서 이병헌이 했던 대사로 한 때 유행했던 말이다. 모히토는 칵테일의 종류이고 몰디브는 섬나라인데, 잘못된 표현임에도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해 한국 영화 사상 명대사 중 하나로 회자 되고 있다. ‘칵테일’은 술과 여러 종류의 음료, 첨가물 등을 섞어 만든 혼합주를 말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칵테일은 지명의 이름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칵테일 중 지역 이름을 따온 칵테일엔 무엇이 있을까.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맨해튼’

‘맨해튼’은 칵테일의 여왕이라 불린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수많은 이민자가 뉴욕에 유입되며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뉴욕에서 뒤섞이게 되었다. 그들은 본국의 전통식·음료들을 가지고 왔고 다양한 음료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만큼 고전적인 칵테일이며 1870년대 뉴욕의 맨해튼 클럽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대통령 후보였던 사무엘 J. 틸든을 축하해 주기 위해 윈스턴 처칠의 어머니 제니 제롬이 파티를 주최했다. 이 파티에서 레인 마샬(Lain Marshall)이라는 바텐더가 만든 기념주가 이 칵테일이라는 것인데, 이 가설이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로 전해진다.
수년간 다른 위스키나 브랜디 등을 섞어 변화하고 진화해 왔고 보통 체리로 장식되지만, 일부 바텐더들은 맛을 위해 올리브나 오렌지 껍질을 꼬아서 첨가하기도 한다. 고전적인 레시피로 만들어진 ‘맨해튼’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칵테일 중 하나다.
두 번째, ‘블루 하와이’
![[사진/Pixabay]](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308/188094_350964_846.jpg)
‘블루 하와이’는 하와이주에서 고안된 것으로 알려진 칵테일이다. 럼 베이스의 칵테일로, 1957년 해리 K. 예(Harry K. Yee)라는 바텐더가 한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회사 제품인 블루 큐라소로 음료를 만들어 달라 부탁받아 만들어 낸 칵테일이라고 한다.
블루 큐라소와 파인애플주스를 쓴다는 점을 빼면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다. 기주로 럼, 보드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며 사이다를 넣는 경우도 있다. 파인애플 스틱과 체리 등으로 가니쉬해서 마무리하는 칵테일이다.
여기에 코코넛 크림이나, 코코넛 술이 들어가면 ‘블루 하와이안’이라는 변형 칵테일이 된다. 한편, ‘블루 하와이’ 칵테일의 무알코올 음료 버전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세 번째, ‘쿠바 리브레’
![[사진/Pixabay]](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308/188094_350965_855.jpg)
1902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가 독립을 위한 전쟁 당시 'Viva Cuva Libre'(자유 쿠바 만세)라는 구호를 사용했는데, 이때 한 미군이 럼에 콜라를 떨어뜨려 마시며 구호를 외친 것에서 유래된 칵테일이다.
럼에 라임 주스나 레몬즙을 넣고 콜라를 채워 만든 알코올음료이다. 탄산음료에 의해 알코올이 희석되기도 해 도수가 낮은 편이며 알코올 특유의 향도 거의 없다. 라임이나 레몬 조각으로 장식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한다.
모든 식·음료 문화에는 각자의 역사와 만들어진 배경이 존재한다. 칵테일에는 독한 칵테일부터 무알코올 칵테일까지 수많은 종류 있고, 개인마다 레시피가 다르기도 하다. 또 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바텐더’라는 직업과 세계 대회까지 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소했던 ‘칵테일’이 이젠 다양한 세계 맥주와 더불어 우리네 일상에 녹아들었고 그만큼 선택지도 많아졌다. 앞으로 또 어디서 어떤 문화가 생기고 섞여들며 새로운 식·음료가 생겨날지 기대가 된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