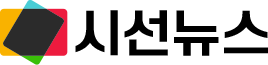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시선뉴스 문선아] 식품의 종류와 양이 풍족한 사회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가공식품은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을 넣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건강에 좋은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은 가격이 점차 오르고 식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가거나 도심에 있는 대형마트까지 가야한다.
이처럼 걸어서 500m 이내에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없는 지역을 ‘식품 사막’이라고 말한다.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소규모 식료품 가게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식품 사막에 놓여진 시민들을 쇼핑 난민이라고 부른다.
사회 빈곤층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일수록 신선식품을 사기가 힘들고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게 된다. 이들은 가공식품에 포함된 첨가물 등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식품 사막의 문제는 199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대두되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신선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신선한 농산물을 공유할 수 있는 푸드뱅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역 공동체 버스를 운용해 편의점과 연계하여 신선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철에 나는 신선식품은 잘 챙겨먹기만 해도 영양소가 고루 갖춰져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상권 파괴와 편의점의 골목진출 등으로 소규모 식료품점이 사라져 취약계층의 건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 조사해 식품에 있어서 거리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