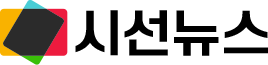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시선뉴스 정유현] 대도시의 공해와 온난화 현상은 도시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히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규모 숲 조성이 불가능한 도시에서 가로수 심기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처음 가로수가 조성되기 시작한 1970년대 6800그루였던 서울시 가로수는 2012년에는 45종, 28만 4000여 그루로 늘어났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대에 따라 가로수에도 유행을 엿볼 수 있는데, 도시의 풍경을 조성하는 가로수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자.
1. 70년대 - 수양버들나무의 잔치
가로수가 정책적으로 거리에 심어지게 된 건 일제강점기부터이다. 일본은 신작로를 건설하면서 대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기 시작했는데, 이때 인기를 끈 나무는 ‘수양버들’이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 자라면 잎가지가 늘어져서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었다. 또 기록에 따르면 선비들이 수양버들나무를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수양버들은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한강 중랑천 안양천 등 주요 하천변을 따라 집중적으로 심어졌다. 1975년 서울 시내에 있던 걸로 집계되는 가로수 6800그루 가운데 수양버들나무가 36%를 차지할 정도로 7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나무는 수양버들나무였다.

2. 80년대 -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나무)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봄이면 수양버들 수나무가 뿌리는 하얀 솜털인 ‘홀씨’ 때문에 시민들은 호흡기 알레르기와 천식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수양버들나무를 지목하기 시작했고, 수양버들나무는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 2014년에는 31그루만 남게 되었다.

수양버들나무를 대체한 나무는 바로 ‘양버즘나무’였는데, 흔히 플라타너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플라타너스 나무는 세계 4대 가로수(피나무 느릅나무 마로니에 양버즘나무)안에 들어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매우 높아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버즘나무에도 단점이 있다. 매우 빠른 성장속도 때문에 양버즘나무는 건물의 높이를 뒤엎기가 일수였고, 나무 때문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불평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990년대들어, 가로수종 다변화에 나섰다. 양버즘나무, 수양버들나무 외에도 다양한 품종의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다.
3. 90년대 - 은행나무
다품종화 되면서 가장 많이 심어진 나무는 바로 ‘은행나무’이다. 1970년대에 비해 가로수 길에는 ‘은행나무’가 35배나 넘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 이유는 1971년 4월 3일 서울시가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나무로 은행나무를 선정한 이후로 꾸준히 은행나무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은행나무의 특징 때문에 특색 있는 거리가 생겨나기도 했다. 바로 강남구 신사동 일대의 ‘가로수길’인데, 여름에는 울창한 녹음이 싱싱한 여름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가을에는 노란 하트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을의 정취를 더욱 풍부하게 느끼게 해준다.

또 은행나무는 경제적이기도 하다. 약을 칠 필요가 없어서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고,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하해 자연 공기 청정기 역할도 해 줘서 현재 은행나무는 서울 도심부터 외곽지역까지 11만 4060그루로 전체 가로수 가운데 가장 많다. 하지만 은행나무의 열매 냄새는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다. 또 가뭄과 무더위로 늘어난 ‘황화현상(엽록소 부족으로 잎이 누렇거나 붉게 변하는 현상)’이 잦은 점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은행나무를 대체할 나무들 몇 가지가 각광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나무’ ‘이팝나무’ ‘벚나무’ ‘느티나무’이다. 최근 새로 주목 받는 나무들의 특징은 꽃이나 잎 모양이 아름답다. 매력적인 도시 가로수를 통한 서울의 정취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