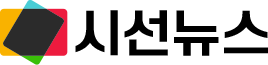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 '왜 문재인인가'를 답하지 못했다 =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프레임(구도) 싸움에서 뒤로 밀렸다. 그동안 민주당은 '박정희'와의 대결에서 '이명박'과의 싸움으로 변경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선거 구도가 '과거(박정희 유신 독재)'에서 '현재(이명박 정권 심판론)'로 이동한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문 후보 측이 선거 막판까지 '왜 문재인인가,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박근혜가 당선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고집했다. 박 후보를 끊임없이 '유신의 딸'이자 '이명박근혜'로 공격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공동책임론'은 이미 4ㆍ11 총선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재탕 전략'이었고 '기울어진 축구장'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정치지형 속에서 정권심판론은 정치적 파급력을 강하게 갖지 못했다.
하지만 '디데이' 일주일 전부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매력적인 구호가 등장하고,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은 찬조연설을 통해 대중들에게 어째서 박 후보가 아닌 문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했다. 하지만 뒤늦은 '왜 문재인인가,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에 답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헤매던 중도층과 무당파들은 끝내 문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 컨트롤타워 부재, 文 캠프의 고질병 = 문재인 캠프의 고질병은 컨트롤타워의 부재였다. 대선처럼 큰 선거판에서 큰 방향을 잡은 후, 일정ㆍ메시지ㆍ공보 전략을 그 방향에 맞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기본이다.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다. 상대편인 박 후보 캠프에는 '야전사령관' 김무성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캠프는 마치 '봉숭아 학당' 같았다. 선대본부장단과 캠프 핵심 4장(비서실장ㆍ상황실장ㆍ전략본부장ㆍ공보단장)은 문 당선인과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대부분 이었고 여기에 '친노 9인방'이 사퇴하면서 균형잡히지 못한 선거 선거운동, 지루하고 결론없이 회의만 난무한 선대위가 돼 버린 것이다.
대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문재인 캠프는 '정세균 원톱 체제'로 전환했다. ‘안철수 현상’을 바라보며 선거운동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말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톱다운'이 제대로 작동하자 전략 기조는 캠프 속속 공유되기 시작했다. 후보의 메시지도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됐고 문재인 캠프는 '광화문 대첩'과 같은 유권자가 공감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히트작을 마구 쏟아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에게는 시간이 부족했다. 보름이라는 시간은 막판 역전 드라마를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 '문안드림' 부동층을 놓치다 = '문안드림.' 문재인-안철수의 화학적 결합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조어는 결과적으로 '드림(dream)'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가 되고 문 후보는 ‘안철수 효과’를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다. 또한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것도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안철수 효과'는 마법이 아닌 ‘거품’에 가까웠다. 안 전 후보는 선거 막판 유권자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대학가와 번화가를 찾았다. 젊은 층의 거점을 공략한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안 전 후보는 젊은 층들과 부동층의 마음을 끄는데 실패했다.
문 후보로서는 안 전 후보의 적극적이지 않은 유세가 아쉬웠다. 안 전 후보의 유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전 후보는 문 후보 지지가 아니라 선거 독려 캠페인만 펼쳤기 때문이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그런 안 전 후보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