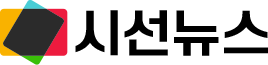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 제왕적 대통령제 이대로 좋은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선거는 도덕적으로 참혹한 일이며, 피만 흘리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처럼 사악하다. 선거에 관여하는 자는 누구나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도 그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후보들의 리더십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티격태격 싸우기 때문이다. 점점 이전투구(泥田鬪狗)의 마당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록 논란, 한·미 FTA 재협상, 박정희 정권 때의 과거사를 둘러싼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네거티브 캠페인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런 캠페인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국가 비전의 경쟁은 실종되고 오로지 힘과 힘이 부딪히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그 최대의 피해자는 안철수 후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치 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상 각 정치 세력이 대통령 권력에 쉽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흔히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일컬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른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같은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을 만큼 제왕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왕조 시대부터 ‘중앙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문정관(問情官)을 지낸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 자신 같은 제목으로 책을 펴내기도 했다. 헨더슨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왕조 시대를 포함한 대한민국(한반도)의 정치사는 중앙 권력을 향한 투쟁의 역사라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대통령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977년에 나온 최인훈(崔仁勳)의 소설 『회색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관은 아마 ‘정감록’이야.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사관, 난 그걸 비난만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태도, ‘그 사람’이 와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역사의 끝장을 낸다는 사상은 바로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대통령 권력을 제왕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사회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는 “우리의 문명이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먼저 위대한 인물에 맹종하는 습관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물론, 지도자의 리더십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리더십은 팀워크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이어야 한다. 2010년 월드컵대회에서 아르헨티나는 걸출한 개인기를 자랑하는 리오넬 메시라는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독일에 4대(對) 0으로 참패당했다. 팀워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례인 것이다.
메시아 혹은 슈퍼스타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중심제는 이제 바뀔 때가 되었다. 잘 알다시피, 군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의 당면 목표는 ‘대통령 직선제’였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는 대의명분이 있었다. 체육관 선거를 계속함으로써 문민 정권의 출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 정권만 물리치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대통령을 잘 뽑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관철되었고, 그 이후 다섯 명의 문민 대통령이 배출되었다.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 권력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는 등 군사 정권 때와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인간적인 세상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자부심을 만천하에 과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문민 대통령들 중에 성공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똑같이 그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좋지 못했다. 준비 부족의 탓도 있겠지만,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후보들도 공약을 남발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거기서 오는 국민적인 실망감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욕구들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욕구의 좌절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비화되기 마련이다.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과 국가 경영의 성공이라는 의욕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 영광은 취임과 더불어 끝난다. 5년 내내 피로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헌법상으로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그 많은 관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책임이 대통령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렇다고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대통령 자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상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치열한 선거전을 통해 집권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나 집단은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에 ‘촛불 집회’로 곤욕을 치른 것이 비근한 사례이다. 그럴수록 반대 진영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부든 여-야 지도자들 간에는 대화 자체가 부족한 편이다.
언론 또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즐기고 있다. 물론, 행정부나 대통령 권력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이다. 매체의 이념 성향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다 중반 이후에는 비판에 열중한다. 그래야 구독률이나 시청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지는 더 좁아진다.
세상은 이미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원화 시대로 변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의 산물이다. 건국 초기나 국가 주도의 개발 시대에 맞는 제도인 것이다. 더욱이 ‘개방, 참여, 공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분권형으로 권력구조를 바꿀 때이다.
분권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선진화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투쟁형이라는 데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야당이 과도하게 정부·여당을 견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다만, 국회의 변화를 단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려워 급진적 분권형인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분단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이원집정부제의 가장 큰 단점은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약점이 있겠지만, 앞서 확인한 대통령중심제의 폐단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다. 대통령중심제 아래서의 여-야 대립은 권력을 장악한 여당과 그렇지 않은 야당 간의 파워 게임인 데 비해,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은 집행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들 간의 이해 다툼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는 “영웅을 필요로 하는 나라는 불행하다.”고 경고했다. 수세기 전에 했던 말인데, 이제야말로 영웅을 필요로 하는 제도의 개선에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대통령 후보들은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개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 중에 당선되는 사람이 그걸 반드시 실천하기를 바란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여론을 두루 수렴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일이다.

- 오피니언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 시선뉴스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