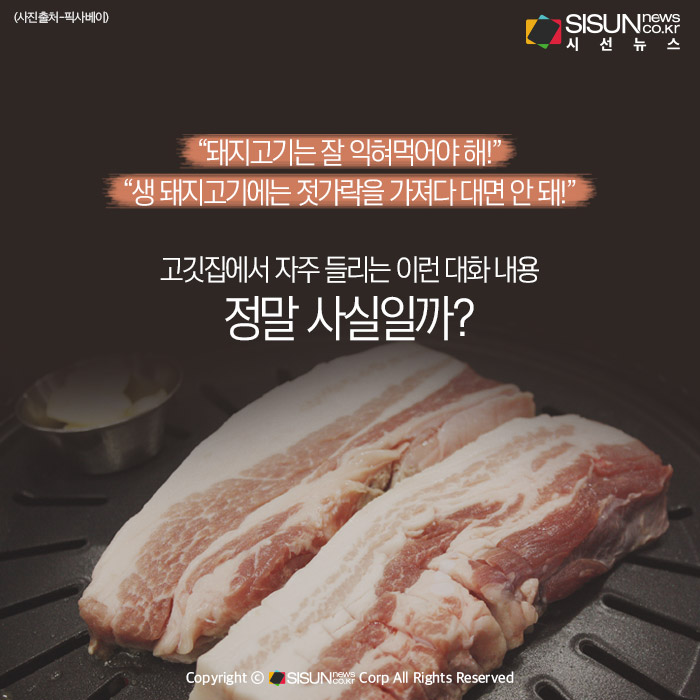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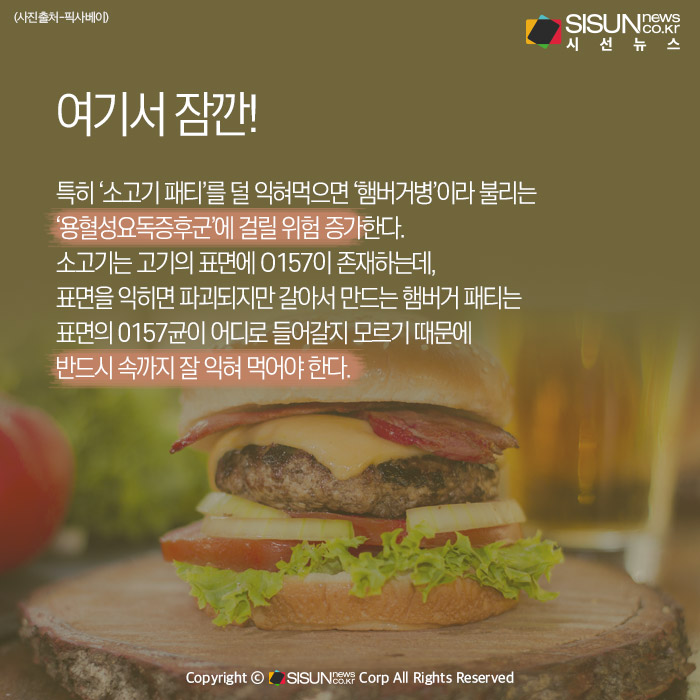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흔히 돼지고기는 잘 익혀먹어야 안전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고, 반대로 소고기는 ‘적당히 익혀 먹어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다. 과연 이 인식은 어떤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을까?
물론 모든 음식은 주의해야 하고, 익혀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특히 돼지고기를 둘러싼 각별한 논란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과거 돼지 사육방식 상 ‘갈고리촌충’ ‘유구낭미충’ ‘섬모충’ ‘톡소포자충’ 등 기생충에 쉽게 감염되곤 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생충 중 ‘갈고리촌충’은 한자리에 있지만 유충인 ‘유구낭미충’은 사람 몸 안에서 돌아다는데, 피부뿐만 아니라 뇌로도 가서 간질 발작의 원인이 되기도 해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기생충들은 높은 온도의 불에 가열해야 죽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익혀먹는 것이 상식이 되어 왔다. 도대체 과거 돼지 사육방식이 어떠했기에 저런 기생충이 돼지고기에 기생할 수 있는 것일까?
충격적이게도 1960,70년대에는 돼지를 기를 때 ‘인분’을 돼지사료로 쓰기도 했다. 그래서 인분에 포함된 다수의 기생충이 돼지로 옮겨가 도축 후에도 고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선이 많다. 의학계나 축산업계는 돼지에 더 이상 인분을 먹이지 않는 요즘엔 감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80년대 들어서 사료만 먹이는 방식으로 사육시스템이 바뀌었고, 1990년을 마지막으로 갈고리촌충의 유충을 보유한 돼지가 발견된 적이 없다.
또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섬모충은 과거 소위 ‘아무거나’ 먹이는 방식의 사육방식에서는 발생할 수 있었으나,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돼지사육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단, 다른 동물들의 변을 먹거나 쥐를 잡아먹는 등 일부 돼지의 경우 ‘톡소포자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만일을 위해 익혀먹는 것이 좋다. 톡소포자충란 숙주를 조종하는 인체감염 기생충으로 간질발작 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기생충이다.
그렇다면 소고기는 왜 덜 익혀먹는 요리법이 고착된 것일까?
소는 돼지와 달리 초식동물 이다. 따라서 잡식인 돼지에 비해 기생충에 노출될 위험이 적다. 또 소에 기생할 수 있는 대표 기생충 무구조충(민촌충)은 돼지 기생충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죽고,뇌에 작용하는 돼지 기생충과 달리 장관 내에 기생하여 복통, 설사 등의 상대적으로 증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소고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덜 익혀 먹는 문화가 발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만약의 기생충과 다양한 균에 대비해 익혀먹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소고기 패티’를 덜 익혀먹으면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릴 위험 증가한다. 소고기는 고기의 표면에 O157이 존재하는데, 표면을 익히면 파괴되지만 갈아서 만드는 햄버거 패티는 표면의 0157균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속까지 잘 익혀 먹어야 한다.
이러한 소와 돼지는 또 그 육질에 따라 요리 법이 달라졌는데, 살코기와 비계가 분리된 돼지고기는 익혀 먹는 요리, 살코기에 지방층이 적당하게 낀 소고기는 덜 익혀먹는 요리가 발달했다고 전해진다.
즉 돼지와 소의 먹이 특성, 그리고 사육 환경에 따른 차이와 또 변화. 거기에 둘의 고기 특성에 따라 잘 익혀먹고, 덜 익혀먹는 요리 방법이 정착 된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가장 정확한 사실은 식재료 특히 육류는 대부분 잘 익혀 먹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