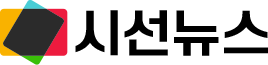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시선뉴스 조재휘] 비상하던 투수가 하루아침에 추락의 길을 걷기도 한다. 제구가 안 되어 스트라이크존에 공을 던지지 못하거나 포볼을 남발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하는데 이들은 제구력 난조에 빠지는 ‘블래스 신드롬’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블래스 신드롬’은 야구 선수가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등 제구력 난조를 겪는 증후군을 말한다. 지난 1971년 피츠버그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오른손 투수 스티브 블래스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스티브 블래스 신드롬, 블래스 증후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투수였던 스티브 블래스는 지난 1968년부터 5년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한 에이스였다. 1972년에 19승을 거둔 블래스는 1973년에 갑자기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고 볼넷을 남발하며 결국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당시 블래스는 수차례 정밀 검사를 하였고 심리 치료까지 받았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사진/Flickr]](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2108/145936_295833_3856.jpg)
야구 경기에서 사람을 맞추거나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두들겨 맞고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이 증세를 나타내는 선수들도 있지만 스티브 블래스처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제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선수마다 약간씩 다른 특징이 있는데 어떤 선수는 제구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수는 특정 구질만 제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의학계에서는 블래스 신드롬을 일종의 심리적 불안증세로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치유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고 힘들어 잘하던 선수들도 갑자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블래스 신드롬의 대표적인 사례는 릭 엔키엘이 있다. 좌완투수였던 그는 지난 2000년 20살의 나이에 11승 7패 방어율 3.50을 기록하며 혜성처럼 등장해 155km대 강속구를 구사했다. 그러나 그해 내셔널리그 애틀랜타와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인 1이닝 5개의 폭투를 던진 뒤 강판되었다.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블래스 신드롬을 극복하지 못한 그는 2005년부터 마운드에서 내려와 타자로 전향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이 증상을 겪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였던 김주찬은 유격수나 3루수를 할 예정이었지만 송구가 자꾸 관중석으로 날아가는 등의 송구로 좌익수나 1루수를 주로 봤다. LG 트윈스 투수였던 심수창은 고교 시절 블래스 신드롬으로 메이저리그 계약이 틀어졌고 한동안 공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두산 베어스의 포수였던 홍성흔은 이 증후군으로 더 이상 포수 마스크를 쓸 수 없었다고 예능프로그램에서 밝혔다. 국내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블래스 신드롬 때문에 선수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배가시켰다.
야구선수에게는 치명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래스 신드롬’. 지금은 야구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인들에게서도 불안장애가 흔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불안감이나 극심한 공포심이 든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