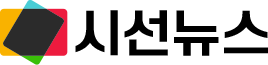[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수습기자] 지난 3월 금감원은 올해 첫 금융사 종합검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업계의 업무활동과 경영 상태를 살핌으로써 금융질서를 챙기는 것이라 설명하지만, 금융업계는 명백한 ‘관치금융’이라며 비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 금융업계를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관치금융 아래에서 법 제도나 시장 원리에 의해 투명하게 금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금융활동이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번 정부의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정부는 관치금융이 아니라 선을 긋고, 금융업계는 불편한 종합검사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는 이유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https://cdn.sisunnews.co.kr/news/photo/201903/100465_220422_4729.jpg)
관치금융 자체는 옳지 못한 행보이다. 관치금융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금융당국이 개입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금융의 자율성을 제약해 시장을 경직화시킬 우려도 있다.
‘관치금융’이 적용된 역사를 살펴보면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당시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 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했다. 그 결과 금리 결정, 신용 배분, 예산, 인사, 조직 등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이 행정부에 예속되었고, 금융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배제한 채 성장주도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도구로 금융을 이용하였다.
관치금융을 앞세운 정부의 이러한 통제는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수출금융에 대한 특혜를 비롯해 저금리 정책에 의한 신용할당 등 수십 종에 이르는 정책 금융으로 나타났다.
IMF 사태 이후 경제위기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면서 본격적으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생겨났다. 관치금융은 정경유착에 의해 자의적으로 금융정책과 간섭이 나타나 경제 회생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은행 인사와 대출에 관련된 사항을 자율화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을 도입하면서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관치금융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금융사 종합검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앞서 2015년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종합검사를 폐지했지만, 지난 2월 정례 회의에서 금감원의 ‘2019년 종합 검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사 경영 상태의 진단과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즉 금융사들의 건전한 경영과 경영 지속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것이 관치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종합 검사가 잘못 나올 경우에는 평판리스크도 나빠질 것이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종합 검사로 인한 금융사의 업무 가중과 비용 증가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금감원과 금융사들 간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면서 금융 산업 내에서 관치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